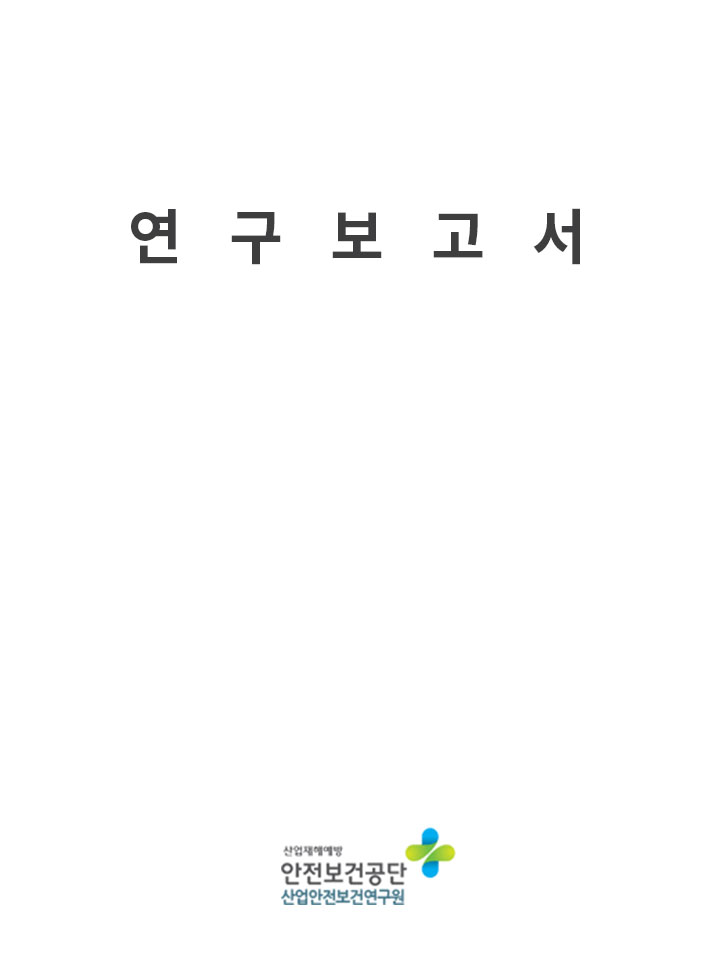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노출기준 추가 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기술적 타당성 평가 연구(Ⅰ)
- 연구책임자
- 변상훈 외 2명
- 수 행 연 도
- 2017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배경 노출기준 설정 대상 화학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2항에 의해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환경 중 해당 물질의 농도의 한계 값을 규제하는 것으로, 실제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활동에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산업현장 내 화학물질 관리에도 사용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6년 12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에서 재해자 수는 90,656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0.6%증가하였고, 화학물질 특히 유기화합물에 의한 질병자와 질병사망자의 증감률이 각각 33.3%와 16.7%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산업현장에서 제조·사용·유통되는 유해화학물질은 그 취급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를 가해 업무상 질병의 증가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근로자의 유해·위험성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노출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고용노동부ㅁ에서는 645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현재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CGIH)에서 권고하고 있는 화학물질 허용농도(Threshold Limit Values, TLVs)는 물질 736종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ACGIH TLVs가 설정된 화학물질 중 국내에서 노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ACGIH와 비교하였을 때 약 90여종이며, 이 중 국내 법(산안법 및 화관법) 관리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물질로는 o-Phthalodinitrile [91-15-6] 등 10종으로 해당 물질에 대한 노출기준의 추가 제정을 통해 산안법령에서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81조의 2(노출기준의 설정 등)의 절차에 따라 선진 외국(미국 ACGIH, 독일 DFG등)에서의 노출기준 및 국내 법령(산업안전보건법과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등)에서 적용이 되어 있지만 국내 노출기준이 미 설정된 물질을 대상으로 유해성·위험성평가 및 노출기준 적용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노출기준을 추가 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 및 산안법령에서의 체계적 관리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국외에서 허용(노출)기준이 지정되어 있고 법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만 국내 노출기준이 미 설정된 화학물질 11종(o-Phthalodinitrile 외 10종)과 사회적 이슈로 문제가 제기된 HCFC-123을 포함한 총 12종의 물질을 연구대상 화학물질로 선정하였다. 2) 연구 대상물질의 건강장해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근거하여 유해성 평가로 작업장 참고농도(Workplace Reference Concentration, RfCwork)를 계산하였다. 3) 연구대상 화학물질 11종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직접 현장방문을 하여 대상 화학물질의 취급실태를 조사하였다. 국내 취급실태파악 결과 7종에 대해 취급실태가 파악되었고, 4종에 대해서는 공정노출이 되지 않거나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4) 12종의 연구대상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추가 제정에 따른 최대 순편익은 2,544(백만원)이고, 편익/비용분석 결과 2.5로 사회·경제성 평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Acetone cyanohydrin, Methylene bis(4-cyclohexylisocyanate)은 조사된 인체연구를 근거로 최종 노출기준 제정안을 각 4.7 ppm(5 mg/m3)과 0.005 ppm(0.054 mg/m3)와 같이 제시하고, 10종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수행된 연구결과(김기연 et al, 2014)를 근거로 노출기준과 RfCwork가 5-10배 차이난다고 가정하여 위에서 수행한 유해성 평가결과에 적용시켰다. 각 12종의 연구대상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o-Phthalodinitrile 1 mg/m3 Monochloro acetic acid 4.7 ppm o,m- Phenylendiamine 0.1 mg/m3 Trichlorophon 0.2 mg/m3 1,3,5-Triglycidyl-s-triazinetrione 0.1 mg/m3 CMIT/MIT 0.1 mg/m3 Calcium chromate 0.001 mg/m3 Di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 10 mg/m3(67 ppm) HCFC-123 10 mg/m3 6) 최종적으로, 연구대상 화학물질 12종의 노출기준 추가 제정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결과를 1안과 2안으로 제시하였다. 3. 연구 활용방안 본 연구는 국내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관리 화학물질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노출기준설정 대상 화학물질이 아닌 물질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81조의2(노출기준의 설정 등)의 절차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평가, 건강장해에 관한 연구·실태조사, 노출기준 적용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노출기준 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근로자 건강보호 및 증진을 목표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의 유해인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 및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노출기준 미설정 물질에 대한 노출량 추정, 유해성평가 등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추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로 노출기준 추가 제정이 필요한 연구대상 화학물질 12종을 선정하였고, 이 물질들에 대한 초기유해성조사 자료로 해당 물질의 건강장해, 유해성초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해성 평가결과와 노출평가 자료를 통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의 화학물질 및 노출기준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 혹은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법적규제물질로의 지정 등의 체계적 규제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고려대대학원 보건과학과 교수 변상훈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센터 이권섭 연구위원
 이전글 이전글 |
산화티타늄 나노입자 취급 사업장에 대한 노출 특성 및 실태에 관한 연구 |
|---|---|
 다음글 다음글 |
흡입노출 실험동물을 이용한 생체영향 지표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