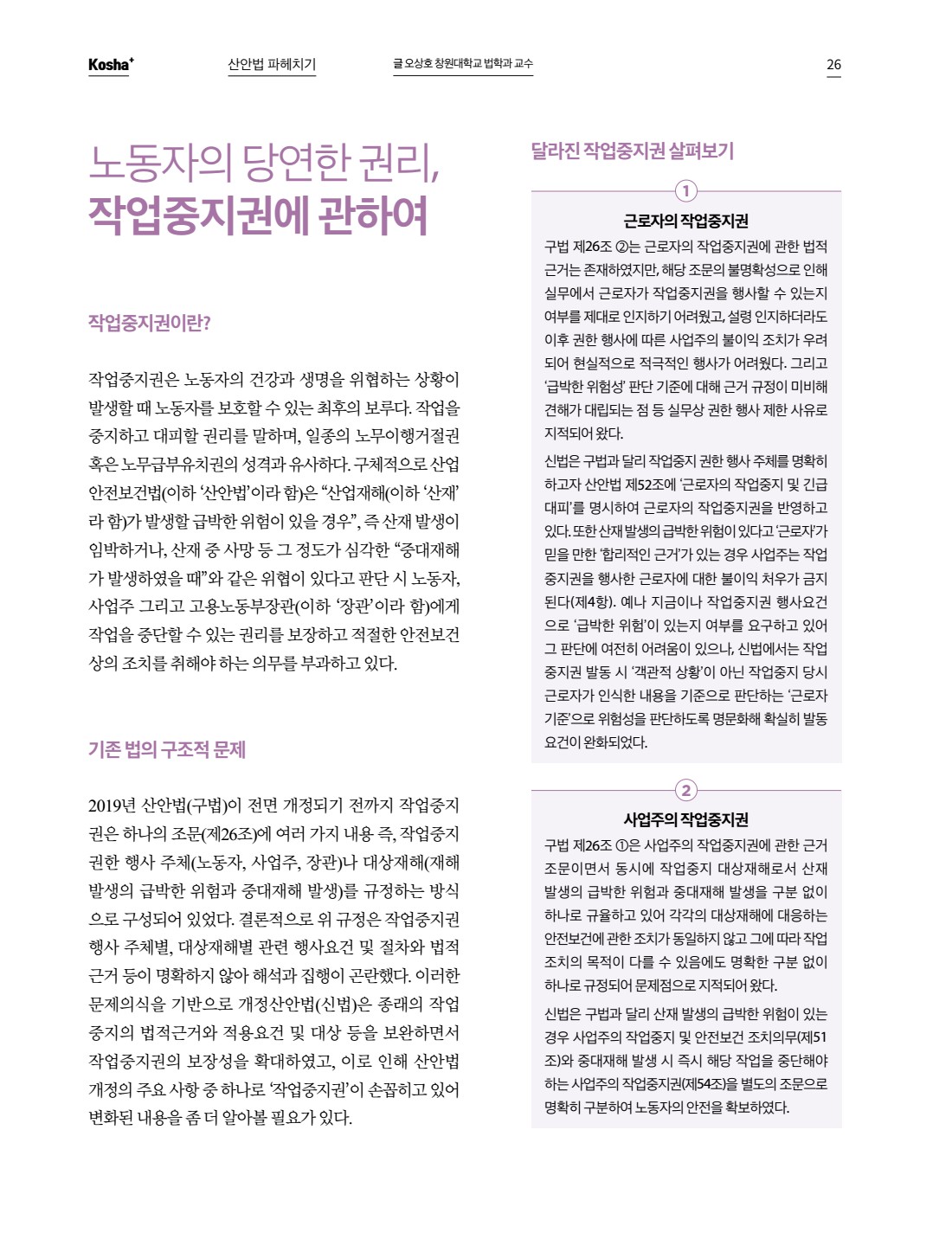
28페이지 내용 :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 작업중지권에 관하여 작업중지권이란? 작업중지권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권리를 말하며, 일종의 노무이행거절권 혹은노무급부유치권의성격과유사하다.구체적으로산업 안전보건법 이하‘산안법’이라함 은“산업재해 이하‘산재’ 라함 가발생할급박한위험이있을경우”,즉산재발생이 임박하거나, 산재 중 사망 등 그 정도가 심각한 “중대재해 가 발생하였을 때”와 같은 위협이 있다고 판단 시 노동자, 사업주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 이하 ‘장관’이라 함 에게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적절한 안전보건 상의조치를취해야하는의무를부과하고있다. 기존 법의 구조적 문제 2019년 산안법 구법 이 전면 개정되기 전까지 작업중지 권은 하나의 조문 제26조 에 여러 가지 내용 즉, 작업중지 권한 행사 주체 노동자, 사업주, 장관 나 대상재해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과 중대재해 발생 를 규정하는 방식 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결론적으로 위 규정은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별, 대상재해별 관련 행사요건 및 절차와 법적 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과 집행이 곤란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개정산안법 신법 은 종래의 작업 중지의 법적근거와 적용요건 및 대상 등을 보완하면서 작업중지권의 보장성을 확대하였고, 이로 인해 산안법 개정의주요사항중하나로‘작업중지권’이손꼽히고있어 변화된내용을좀더알아볼필요가있다. 달라진 작업중지권 살펴보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구법 제26조 ②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에 관한 법적 근거는 존재하였지만, 해당 조문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실무에서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웠고, 설령 인지하더라도 이후 권한 행사에 따른 사업주의 불이익 조치가 우려 되어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행사가 어려웠다. 그리고 ‘급박한 위험성’ 판단 기준에 대해 근거 규정이 미비해 견해가 대립되는 점 등 실무상 권한 행사 제한 사유로 지적되어 왔다. 신법은 구법과 달리 작업중지 권한 행사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산안법 제52조에 ‘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긴급 대피’를 명시하여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반영하고 있다.또한산재발생의급박한위험이있다고‘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작업 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가 금지 된다 제4항 예나 지금이나 작업중지권 행사요건 으로 ‘급박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요구하고 있어 그 판단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으나, 신법에서는 작업 중지권 발동 시 ‘객관적 상황’이 아닌 작업중지 당시 근로자가 인식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위험성을 판단하도록 명문화해 확실히 발동 요건이 완화되었다. 1 사업주의 작업중지권 구법 제26조 ①은 사업주의 작업중지권에 관한 근거 조문이면서 동시에 작업중지 대상재해로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과 중대재해 발생을 구분 없이 하나로 규율하고 있어 각각의 대상재해에 대응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가 동일하지 않고 그에 따라 작업 조치의 목적이 다를 수 있음에도 명확한 구분 없이 하나로 규정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신법은 구법과 달리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작업중지 및 안전보건 조치의무 제51 조 와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사업주의 작업중지권 제54조 을 별도의 조문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였다. 2 Kosha+ 산안법 파헤치기 글 오상호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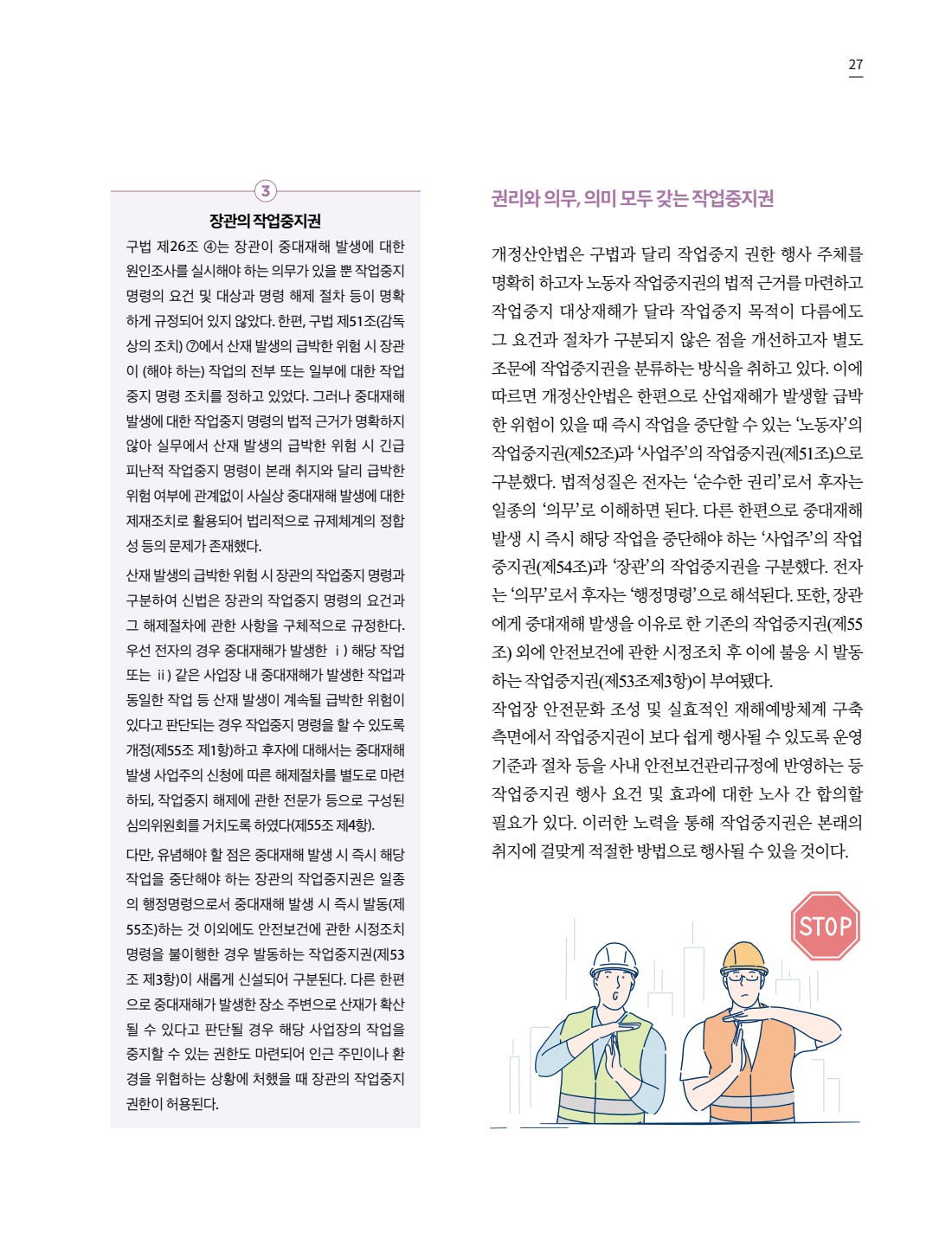
29페이지 내용 : 권리와 의무, 의미 모두 갖는 작업중지권 개정산안법은 구법과 달리 작업중지 권한 행사 주체를 명확히하고자노동자작업중지권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 작업중지 대상재해가 달라 작업중지 목적이 다름에도 그 요건과 절차가 구분되지 않은 점을 개선하고자 별도 조문에 작업중지권을 분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정산안법은 한편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 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제52조 과‘사업주’의작업중지권 제51조 으로 구분했다. 법적성질은 전자는 ‘순수한 권리’로서 후자는 일종의 ‘의무’로 이해하면 된다. 다른 한편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사업주’의 작업 중지권 제54조 과 ‘장관’의 작업중지권을 구분했다. 전자 는‘의무’로서후자는‘행정명령’으로해석된다.또한,장관 에게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한 기존의 작업중지권 제55 조 외에 안전보건에 관한 시정조치 후 이에 불응 시 발동 하는작업중지권 제53조제3항 이부여됐다. 작업장 안전문화 조성 및 실효적인 재해예방체계 구축 측면에서 작업중지권이 보다 쉽게 행사될 수 있도록 운영 기준과 절차 등을 사내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는 등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및 효과에 대한 노사 간 합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작업중지권은 본래의 취지에걸맞게적절한방법으로행사될수있을것이다. 장관의 작업중지권 구법 제26조 ④는 장관이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 작업중지 명령의 요건 및 대상과 명령 해제 절차 등이 명확 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구법 제51조 감독 상의 조치 ⑦에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장관 이 해야 하는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 조치를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에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긴급 피난적 작업중지 명령이 본래 취지와 달리 급박한 위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제재조치로 활용되어 법리적으로 규제체계의 정합 성 등의 문제가 존재했다.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과 구분하여 신법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의 요건과 그 해제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우선 전자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ⅰ 해당 작업 또는 ⅱ 같은 사업장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등 산재 발생이 계속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 제55조 제1항 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의 신청에 따른 해제절차를 별도로 마련 하되,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였다 제55조 제4항 다만, 유념해야 할 점은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장관의 작업중지권은 일종 의 행정명령으로서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발동 제 55조 하는 것 이외에도 안전보건에 관한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발동하는 작업중지권 제53 조 제3항 이 새롭게 신설되어 구분된다. 다른 한편 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재가 확산 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도 마련되어 인근 주민이나 환 경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장관의 작업중지 권한이 허용된다. 327